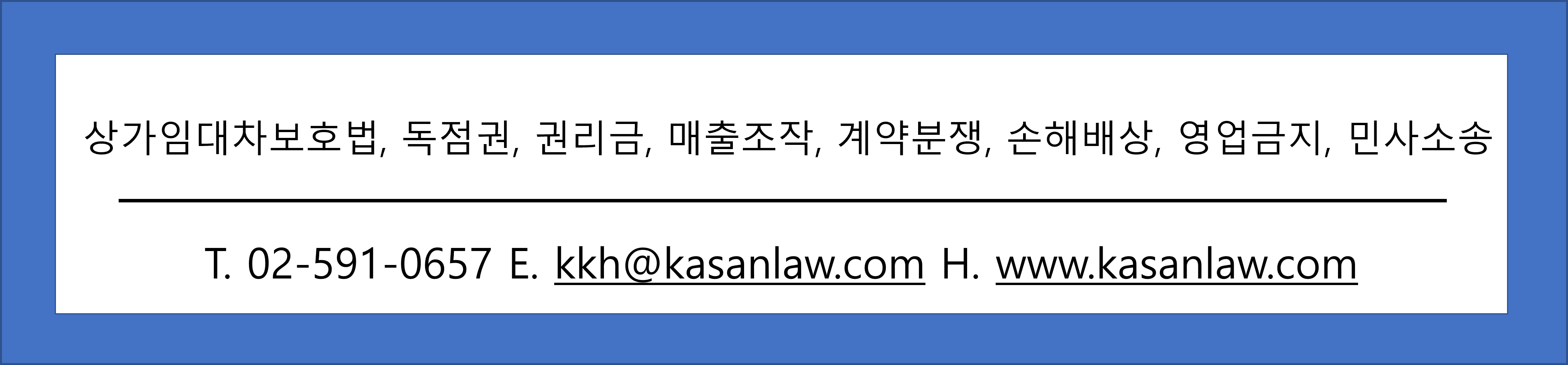(1) 분양계약서에서 업종 제한 조항을 두는 경우에 어떠한 범위의 업종변경을 제한할 것인가, 업종변경을 절대적으로 금지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한 범위에서 변경을 허용할 것인가는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것이고,
(2) 업종변경의 허부, 범위 및 절차 등은 분양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을 통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도 분양회사가 수분양자에게 특정 영업을 정하여 분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분양자에게 그 업종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3) 한편, 건축주가 상가를 건축하여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경우 점포의 수분양자나 그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 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따라서 이와 같은 업종 제한 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1179 판결,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79258 판결 등 참조).
(5) 건물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나 대규모점포 폐업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 및 관리규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채권자들 역시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에 기한 업종 제한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6) 그러나 그 관리규약 제88조는 ’102호는 약국 지정호수로 하며 다른 점포의 수분양자는 같은 업종을 입점할 수 없다. 추후 본 관리규약을 변경하거나, 재제정시 이 내용을상정하기로 한다.‘라고 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정 제16조 제2항은 ‘102호의 경우 약국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른 점포에는 이와 동일한 업종을 허용할 수 없다’라고 정하였다. 즉, 위 각 관리규약과 관리규정이 각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가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의 임차인들 사이에 이 사건 상가가 약국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어 다른 상가에서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점이 용인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각 상가의 임차인들은 이러한 업종 제한 약정을 임대차계약 당시 수분양자들로부터 고지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