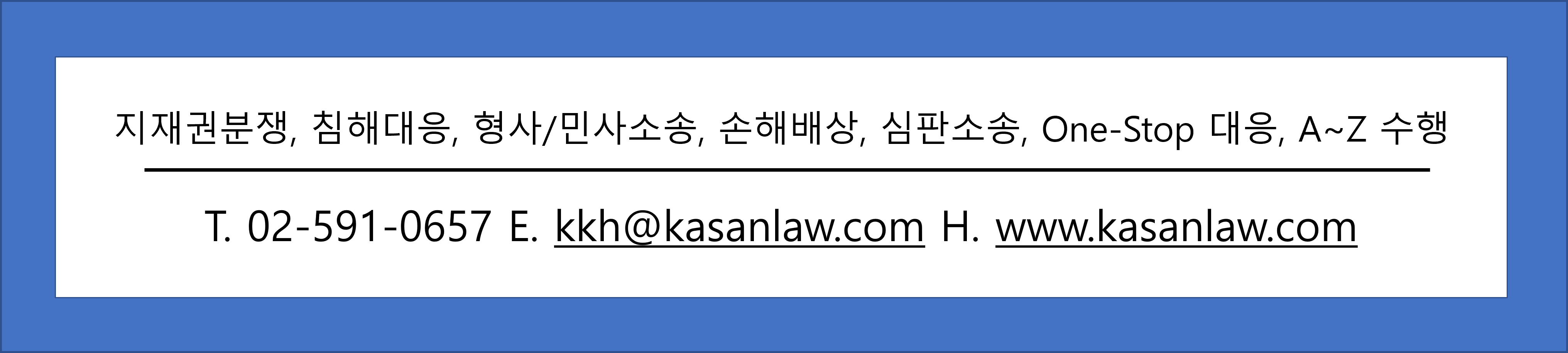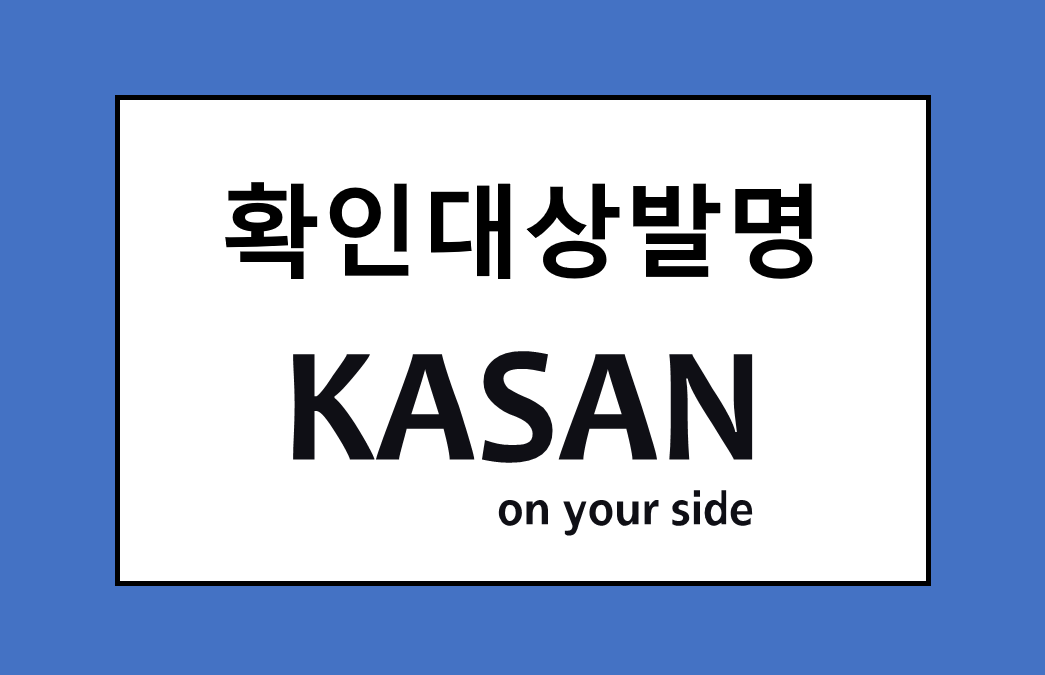
(1) 특허권자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특허심판원 심결 – 피심판청구인은 실시주장발명 불실시, 확인대상발명 불특정, 부적법한 심판청구, 각하 심결
(3) 특허법원 판결: 피고의 실시주장발명 실시, 확인대상발명 특정, 권리범위에 속함, 심결취소 판결
(4)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나, 그 특정을 위하여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고(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후85 판결 참조), 확인대상발명도 별지 등의 형태로 심결에서 주문의 일부가 되므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바람직하다(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도 참조).
(5) 방법발명의 특허권자가 어떤 물건이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고 주장하면서 물건발명을 확인대상으로 삼아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는 있다(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한 특허법 제127조 제2호, 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후1109 판결 등 참조).
(6) 특허권자가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지 아니한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7) 이때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후2626 판결 참조).
(8) 특허법 제135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대상물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으로, 그 대상물은 심판청구인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실시 형태인 확인대상발명이다.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고(특허법 제94조 제1항), 특허발명이 물건발명이라면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청약하는 행위가 물건발명의 실시이므로[특허법 제2조 제3호 (가)목], 물건발명의 특허권은 물건 발명과 같은 구성을 가진 물건이 실시되었다면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그 물건에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는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그 제조방법과 관계없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확인을 구할 수 있고, 이때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나 도면에 확인대상발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부연 설명으로 제조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물건만이 심판 대상인 확인대상발명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9후11541 판결 참조).
(9) 마찬가지로, 물건발명의 특허권자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면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등에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한 물건을 사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부가적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그 물건을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만이 심판 대상으로서 확인대상발명이 되는 것은 아니다.
(10)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경우 심판청구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그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는지는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와 도면을 일체로 파악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발명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확인대상발명은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1후10725 판결 참조).
(11) 물건발명은 원칙적으로 발명 대상인 물건의 구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특정하고 청구범위에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을 기재하였더라도 그 사용방법이 특별히 물건의 구조나 성질 등을 한정하는 요소가 아닌 한 청구범위 해석이나 발명의 동일성 판단에 고려할 것은 아니다.
(12) 방법발명에서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 방법발명 실시에 해당하나[특허법 제2조 제3호 (나)목 참조],2) 물건발명에서 물건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물건이 완성된 연후의 문제이므로, 사용방법에 관한 기재가 물건 자체를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특허법 제42조 제6항,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청구범위 해석’에 관한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첨부: 특허법원 2024. 4. 4. 선고 2023허11944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